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말뜻 그대로 풀어본다면, 무언가 사적인 소유물을 사회적으로 공유해서 가치를 높인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특히 공유경제가 각광받는 것은 우버와 에어비앤비라는 스타트업의 초대박 성공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공유경제가 어떤 의미인지부터 정의하면 어떨까요?
공유경제란 무엇인가?

공유경제의 원칙적인 개념은 각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유휴자원들을 놀리지 않고 공유함으로써 활용도를 극대화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자가용은 다섯 명까지 탈 수 있는데, 대부분 운전자 한 명만 탄 채 운행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당한 자원의 낭비이지요. 그러니 공유경제의 가장 전통적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카풀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타고 가는 것이지요. 비슷하게 지인들끼리 공동으로 콘도나 별장을 일정기간 동안 빌린 다음, 휴가철에 서로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예도 있지요.
예전에는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좁은 범위에서만 공유가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기술발달로 인하여 훨씬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 체계으로 유휴자산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는 그냥 지입제 택시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택시라고 봐도 될 듯합니다. 우버는 아직 상장되지 않았지만,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가치평가 제안서에서 기업가치를 무려 1,200억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빅3 자동차 회사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비즈니스 모델로만 본다면 전혀 새로울 것이 없지 않나요?
주택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민박주선업을 글로벌 단위로 키운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에어비앤비는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주목받게 되었을까요?
핵심은 ‘공유’ 아닌 ‘연결’


사진 출처 우버 블로그(위쪽)와 에어비앤비 홈페이지(아래쪽)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은 처음에는 수익을 얻을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개념으로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가진 유휴자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쉽게 매칭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전 세계에 걸쳐 유휴자산을 대여하려는 사람과 그것을 사용하려는 사람을 쉽게 이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아도 분명히 우버나 에어비앤비는 기존의 운수업이나 숙박업과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운수업이나 숙박업은 차량이나 펜션과 같은 자산을 자기가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전적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보유하기 때문입니다.
공유경제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시장규모가 커지자, 우버나 에어비앤비를 통해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차량이나 집과 같은 자산을 보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운수업이나 숙박업과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하지만 공유경제 서비스는 전통적 서비스 비즈니스와 달리,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모바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 등 최신IT기술을 활용하여 매칭 과정을 매우 효율적으로 수행해줍니다. 과거에 비해서 훨씬 다양한 범위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매칭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는 공급자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까지 대거 시장에 들어옴으로써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성과 이질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지요.
공유경제의 핵심은 공유보다는 오히려 ‘연결’에 있다는 말씀이네요. 특히 그 연결이 인터넷 네트워크와 만나서 전 세계적으로 펼쳐진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겠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우버 서비스가 없지만, 유사한 서비스로는 대리기사 서비스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대리기사 회사를 공유경제라고 부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연결’을 주업으로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리기사 서비스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택시는 25만대 수준인데, 대리기사는 무려 20만 명이 뛰고 있다고 합니다. 공유경제라는 이름의 ‘연결 서비스’로 인해 과잉공급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공유경제, 보완할까 대체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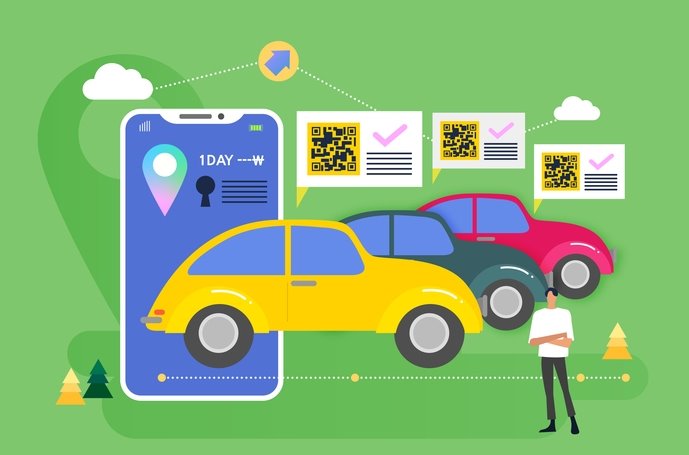
공유경제의 핵심이 공유가 아니라 연결에 있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공유경제라고 불리는 많은 서비스들은 이미 공유라기보다는 렌탈Rental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따라서 공유경제보다는 접근경제Access Economy나 온디맨드 경제On-Demand Economy가 더 적절한 개념이라는 주장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새로운 서비스들은 비록 수요와 공급의 연결과정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서비스는 오프라인상에서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넓게 포괄해서 ‘O2O Online to Offline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들게 되니, 기존의 전통적인 오프라인 기반 서비스업과 영역이 많이 겹치게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기존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기존 오프라인 서비스 업계와 충돌할 일도 없겠지만, 우버는 기존의 택시업과 겹치고, 에어비앤비는 숙박업과 겹칩니다. 온라인 기반서비스들이 기존의 오프라인 서비스가 못하던 부분을 제공하면서 보완재 역할을 한다면 기존 서비스에 미치는 타격이 크지 않겠지만, 대체재 역할을 한다면 기존 서비스들은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버 서비스가 비용문제(저소득 소비자가 택시비를 감당하기 힘듦, 지역 문제 택시를 잡기 어려움)로 택시를 탈 수 없었던 사람에게 제공된다면 기존의 택시업계와 경쟁관계가 아닐 것이고, 에어비앤비도 기존의 숙박업이 커버하지 못하는 수요를 대상으로 한다면 역시 대체재가 아니라 전체적인 관광수요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버가 없었어도 어차피 택시를 탔을 사람, 에어비앤비가 아니었어도 그 지역으로 여행을 갔을 사람들을 더 낮은 가격으로 빼앗아오는 대체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포스트는 『4차 산업혁명, 당신이 놓치는 12가지 질문』(남충현, 하승주)를 바탕으로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

'경제상식 경제공부 > 4차 산업혁명, 당신이 놓치는 12가지 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마트팩토리, 어떻게 진화할까? (0) | 2019.10.07 |
|---|---|
| 택시 vs 우버, 경쟁력 차이는? :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 (0) | 2019.10.02 |
| 사물인터넷은 어떤 분야에 주목받을까? (0) | 2019.09.26 |
| 사물인터넷, 기존 인터넷과 무엇이 다를까 (0) | 2019.09.25 |
| 미래 의료는 어떤 모습일까? :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헬스 (0) | 2019.09.23 |




